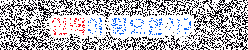
|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구분하는 기본방법 | ||||||
| ||||||
|
때문에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토지이용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없지만, 양자의 소유가 분리되는 경우 특히 토지이용관계를 현실화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로 분리되는 때에는 건물소유자를 위해서 地上權(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하지 않으면 건물소유자는 아무런 권리없이(권리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적인 권리화하여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우리 법제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데 법정지상권제도의 의의가 있다. 法定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法定地上權이라 함은, 법으로 정한 지상권, 즉 사적인 합의인 지상권계약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이 법으로 강제되어진 지상권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이다. 첫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민법 366조) 둘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소유자가 변동된 때(민법 305조 1항) 셋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0조) 넷째,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입목법 6조) 한편, 위 4가지 법정지상권과 별개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협의의 법정지상권을 포괄하여 광의의 법정지상권으로 칭해지고 있는데, 협의의 법정지상권처럼 성립근거가 법으로 명문화되는지 않지만 협의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다가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강제적인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습법을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법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하는 것은 결국 동일인의 소유하에 있던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 따라 토지, 건물 소유권이 분리되었으면 민법 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이, 매매에 의해 분리되었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甲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철거에 관한 별다른 합의없이 건물만을 乙에게 매매했는데, 그 후 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 이 건물이 경매에 부쳐져 丙이 낙찰받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함께 하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된 원인은 ‘매매’라는 점에서 건물 소유권자가 된 乙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丙에게 낙찰되었다면 丙은 乙이 가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건물소유권과 함께 취득하게 된다. 건물을 설정되어있던 저당권의 실행을 통해 丙이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丙이 새삼스럽게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함께하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최초에 분리될 때의 원인에 따라 성립되는 법정지상권의 종류가 좌우되는 것이다. | ||||||
'생활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동산 가계약 파기 및 가계약금 반환의 판례 법리 (0) | 2020.01.17 |
|---|---|
| 임대인의 거부 의사 확실하면 신규 임차인 주선 안 해도 손해 배상 청구 가능 (0) | 2020.01.17 |
| [스크랩] [칼럼] - 재판 이기는 법 (0) | 2012.09.20 |
| [스크랩] 상가임대차관련법률 (0) | 2011.11.24 |
| [스크랩]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0) | 2009.07.13 |
 @
@